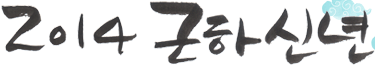대전의 감성을 아름다운 ‘눈물’ 안에 넣었던 시인 박용래. ‘눈물의 시인’은 그의 영원한 닉네임이 되었다. 자연주의적 서정 세계를 개척한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시인인 그에게 눈물은 가족사와 연결돼 있다. 1925년 충남 부여에서 3남 1녀 중 바로 위 누나와 열 살이 넘는 터울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였기에 누이에 대한 마음은 남달랐으리라. 그런데 바로 손위 누이가 출가한 후 초산의 산고로 세상을 떠났고 충격을 받은 그는 내성적이고 우울한 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품행 면에 있어서 늘 모범적이어서 강경상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은행 전신인 조선은행 서울 본점에 입사한다.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시기는 1945년 대전으로 전근 후 은행을 그만둔 시점부터다. 그러니 대전이 박용래라는 사람을 시인의 길로 접어들게 한 출발지인 셈이다.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된 그는 김소운 시인을 찾아가 50여일 더부살이를 지내기도 하고 계룡산 사찰과 부여 일대 백제 유적을 답사하면서 시를 습작했다. 1946년에는 정훈, 박희선, 하유상 등과 함께 ‘동백 시인회’를 조직하여 《동백》을 창간했는데, 이 동인지는 훗날 대전‧충남 문단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호서중학교, 보문중학교 교사 등을 거쳐 1955년 대전철도학교 교사로 지내던 해, 그는 《현대문학》에 「가을의 노래」로 박두진(朴斗鎭) 선생의 초회 추천을 받고, 이듬해에 「황토길」,「땅」으로 완료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결혼과 함께 대전 오류동에 정착한 그는 아예 전업시인으로 살며 집필에만 몰두했고 생계는 아내가 도맡았다. 그런 그를 가리켜 서정주 시인은 ‘새장속의 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용래 시인의 작품세계는 1950년대 전·후 한국전쟁과 폐허의 시대에서 허무주의와 감각주의를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적 서정시의 원점에서 조금도 비껴 서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시세계를 전진시켜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반문명, 반사회, 반현실적인 것들을 시적 기반으로 삼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형성화시키는데 주력했다. 그의 시적 성향이 생명과 연민인 것은 어린 시절에 타계한 누이의 죽음, 식민지 말기의 강제징집, 해방 이후의 소용돌이와 6.25동란의 체험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당대 역사의 격동이나 시류에 상관없이 자연과 한국적 정한의 발견이란 길을 걸었던 그를 두고 감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난 또한 있었다. 그러나 향토적 서정이 물씬 배어있는 시 세계를 오롯이 일궈낸 그는 대전의 대표시인으로서 충청 지역의 후배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다.
안타깝게도 그는 1980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하고 3개월 동안 입원치료 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11월 20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다. 그 후 12월, 시 「먼 바다」와 시집 『백발의 꽃대궁』으로 《한국문학》 제정 제7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으며 1984년 10월 27일 대전 보문산 사정공원에 ‘박용래시비’가 세워졌다.

생전의 시인과 술자리에서 어울리곤 하던 이문구 작가는 「박용래 약전(略傳)」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그의 눈물을 불렀다. 갸륵한 것, 어여쁜 것, 소박한 것, 조촐한 것, 조용한 것, 알뜰한 것, 인간의 손을 안 탄 것, 문명의 때가 아니 묻은 것, 임자가 없는 것,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 갓 태어난 것, 저절로 묵은 것…. 그는 누리의 온갖 생령에서 천체의 흔적에 이르도록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사랑스러운 것들을 만날 적마다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내면과 그 마음을 시에서 그대로 보여준 ‘눈물의 시인’ 박용래시인의 삶과 작품세계는 대전문학관 상설전시실에서 연중 만날 수 있다. 시인이 생전에 남긴 육필원고와 작품들, 유품과 사진을 비롯해 그의 딸 박연(화가) 작가가 그린 시인의 초상화 등을 통해 시인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안수희(문학관운영팀) / dlc310@dcaf.or.kr / 042-621-5022